이번엔 '학교 주변에서 지구과학 요소 찾기'를 써보려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산밑이기 때문에 거의 자연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처음에 이 주제를 받고 음... 어디서 뭘 찾아야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쉬울 것 같았는데 막상 찾아보니 잘 안보이기도 하고 떠오르는 것은 너무 흔한 주제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봄에서 초여름 쯤이었는데, 산책을 하면서 민들레가 많이 보였습니다. 홀씨가 된 민들레를 보며 음? 행성상성운? 을 떠올리게 되었고 민들레의 일생과 별의 일생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민들레와 별의 일생' 이라는 주제를 준비하여 친구들과 발표했습니다.

민들레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란색 꽃잎을 가진 민들레는 수정이 되면 홀씨 형태로 씨앗을 만들어 바람에 날아가는 식물입니다. 위의 사진은 민들레의 일생입니다.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 솜처럼 보이는 '관모'를 구의 형태로 활짝 피게 됩니다. 바람에 날아간 씨앗은 그 자리에서 꽃을 다시 피우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에서 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별의 일생과 행성상 성운을 설명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시별의 탄생


우주에는 티끌과 기체(수소 >>> 헬륨)인 성간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몰려있는 곳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성운에서 이 물질들의 밀도가 높거나 온도가 낮은 곳은 중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주위 물질들은 이 중력에 이끌려 회전하면서 낙하하고 뭉쳐지는 중력 수축을 합니다. 많은 물질들이 한 곳으로 수축하니 당연히 중심부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열은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점차 온도가 올라가면서 10만 K에 도달하면, 끌어당기는 중력과 표면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복사압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정역학적 평형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평형에 도달하여 원시별이 탄생합니다.
2. 전주계열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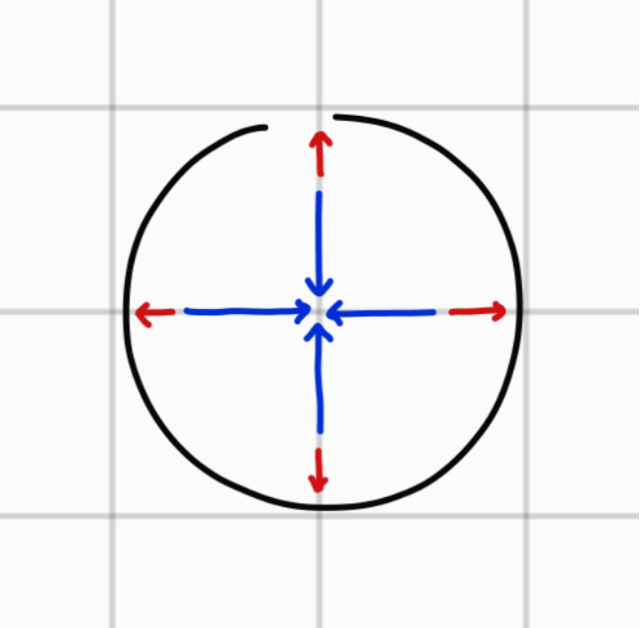
원시별이 탄생한 이후, 주위의 성간물질들이 다시 중심부로 유입되면서 중력이 커지고, 중력이 복사압보다 커지면 다시 수축을 시작합니다. 계속된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1000만 K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중심부의 수소들이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주계열의 전단계라고 하여 전주계열 단계라 하고 이 때의 별을 전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3. 주계열 단계 (태양만한 별)


주계열 단계는 별이 가장 오래 머물고 가장 안정적인 단계로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중심부에 수소들이 핵융합하여 헬륨을 형성하고(PP chain), 매우 많은 열과 빛을 방출합니다.
4. 적색거성 단계


수소를 모두 사용하여 고갈되면 그 중심부는 헬륨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중심부가 수축하고 온도가 올라가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부에선 헬륨 핵융합이 그 겉껍질에선 중심부의 온도 때문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표피는 점점 팽창하여 크기가 커지게 되고 색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적색거성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붉은색을 띠는 것이 보이죠?
5. 행성상 성운과 백색왜성

헬륨 핵융합 이후 탄소가 생성되고 탄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상태로 핵융합이 멈춥니다. 중심부는 중력에 의해 수축해 탄소로 이루어진 백색왜성을 형성하고, 적색거성의 외피층이 수만 년에 걸쳐 별의 밝기가 변하는 맥동운동을 하며 막대한 복사압으로 인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져 질량이 매우 감소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민들레의 개화, 수정과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민들레가 개화하고 수정되어 관모를 형성하는 과정이, 핵융합을 하고 표피가 팽창하며 백색왜성과 행성상 성운을 만드는 태양만한 별의 일생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초점을 둔 행성상 성운과 백색왜성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가보겠습니다.

* 행성상 성운
적색거성의 외피층이 팽창하여 행성상 성운이 형성되었습니다. 중심별은 백색왜성이 되며 자외선을 방출하며 외피를 전리시킵니다. 기체를 들뜨게 해서 행성상 성운이 색을 띄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많이 알려진 다음 행성상 성운은 M57, 고리성운입니다. 중심부에는 백색왜성이 보이고 있고 푸른색, 녹색, 붉은색을 띠는 행성상 성운이 고리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색을 만드는 요소는 금지선인 OⅢ와 NⅡ, 수소 발머계열의 방출선입니다.
- 금지선
먼저 금지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지선은 말그대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 전이가 된 선입니다.
* OⅢ
OⅢ는 산소가 이온화된 O2+ 입니다. 산소는 전자를 얻어야 하는데 전자를 잃었습니다. 벌써부터 이상하죠.
전자가 이온화되기 위해선 전자껍질 간의 이동(전자 전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선 몇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금지선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금지'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금지선이 우주에서는 관측될 수 있습니다. 그중 이중전리산소는 행성상 성운에 존재하여 푸른색, 녹색을 띠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 NⅡ
NⅡ는 질소가 이온화된 N+ 입니다. 이 이온의 방출선 역시 금지선으로 붉은색을 띱니다.
- 수소 발머계열 방출선
수소 발머계열 방출선은 붉은색을 띠게 합니다.

위의 행성상 성운은 Abell 39입니다. 거의 완벽한 구를 이루고 있고, 중심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운처럼 완벽한 구를 형성하는 행성상 성운은 전체의 20% 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심별이 쌍성이거나, 항성풍과 자기장 등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성상 성운이 모두 날아가버리면 중심별인 백색왜성만 남게 됩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를 불고 그 중심만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부터는 백색왜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백색왜성

적색거성의 중심부인 탄소핵은 수축하는데 밀도가 굉장히 커지고 온도는 매우 높습니다. 밀도가 높아져서 전자들의 간격이 좁아지면 전자 축퇴가 일어나고 전자 반발력으로 인한 한계까지 수축을 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백색왜성이라고 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없고 핵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에너지만 방출하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식어갑니다. 다이아몬드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별의 일생을 민들레의 일생에 빗대어 보았습니다. 지구과학에서 천문학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고, 금지선 같이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지구과학 요소를 찾아보는 건 어떤가요?
'과학 > 지구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체지구] Rain to be (1) | 2023.10.08 |
|---|
